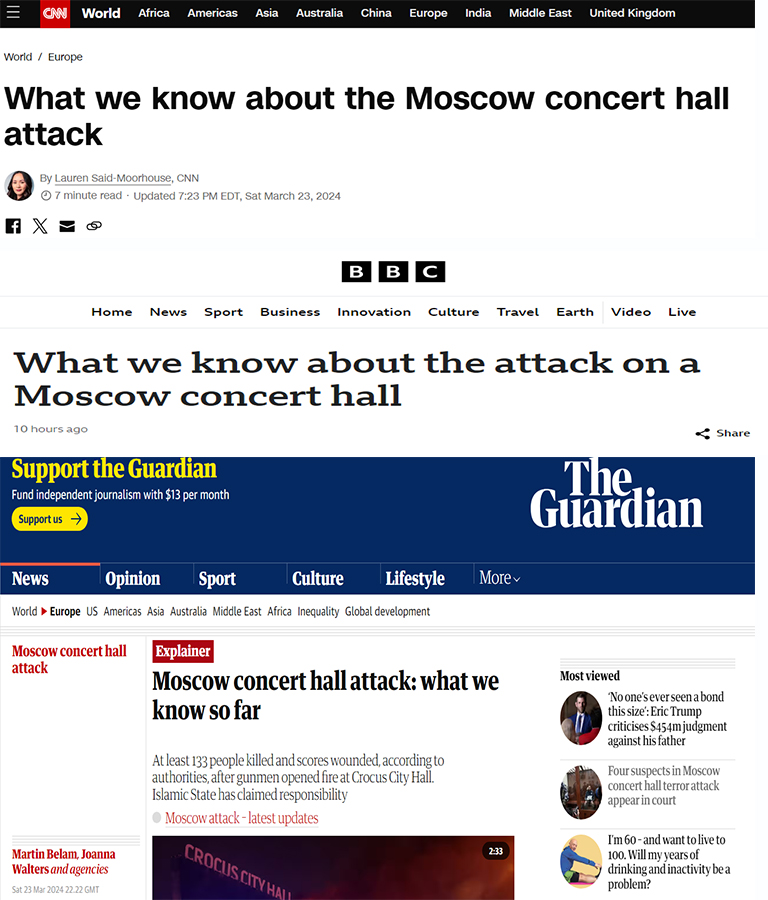
CNN은 3월 22일 모스크바 테러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우리가 테러에 관해 아는 것(What we know about the Moscow concert hall attack)‘이란 제목을 달았다. BBC도 ‘우리가 테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What we know about the attack on a Moscow concert hall)‘로 같은 제목의 기사를 걸었다. 가디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Moscow concert hall attack: what we know so far)'로 헤드라인을 걸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Here’s What We Know About the Moscow Concert Hall Attack)의 제목을 뽑았다. NYT는 중요 사안일 경우 별도 페이지를 운영한다. 보통 최신 정보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내세운다. 모스크바 테러 뉴스는 "(독자가) 알아야 할 것(Here’s what to know about the attack.)"을 업데이트 페이지 안에 별도로 정리했다.
이같은 기사 정리와 내용 구분, 별도 페이지 운영은 모두 사건 발생 수시간 내에 이뤄진다. 관련 매뉴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재해•재난, 사건•사고 등 심각하고 복잡한 이슈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뉴스룸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보여줄지 표준화된 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종의 정보 구성 템플릿으로 기사 뷰 페이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그릇이다.
예를 들면 사건의 개요-피해 규모-이해 관계자의 발표 내용 등이다. 같은 페이지 안에 관련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사건에 연결된 다른 주제의 기사를 놓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조화 한다. 또 인터랙티브 맵, 비디오 및 오디오 등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하이퍼링크를 충분히 적용한다.
대체로 온라인 저널리즘을 심화하는 서구 언론사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들 언론사는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나열하는 대신 기자가 기사 공개 시점까지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당연하겠지만 독자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때 정부, 경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내용을 기초로 한다. 사상자, 실종자 등 사건의 피해 규모를 헤아릴 수 있는 수치는 민감하다. 혐의자를 특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언론사가 혐오와 갈등을 앞장서 부추기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혼란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전하는 소셜미디어에 끼인 언론사에 ‘팩트 체킹’은 신속한 보도에 앞서는 진정한 차별성, 매체 경쟁력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은 ‘우리(we)'다. 이 기사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제한(control) 주체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의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능동적 주도적 태도다. 동시에 매체 스스로 책임성을 기하는 집중과 선택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은 독자에게 다른 기사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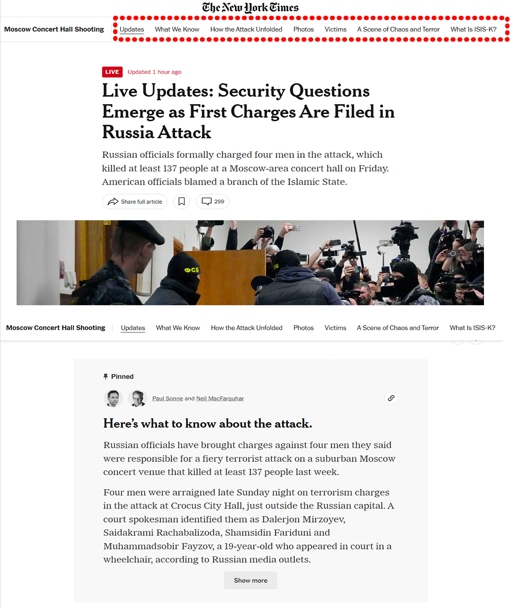
한국 언론은 시간대별, 주제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한 페이지 상에 계속 업데이트하여 전하는 일반의 스타일이 없다. 특히 실시간 뉴스 소비에 휩쓸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를 분절적으로 처리-작은 기사로 쏟아내는데 익숙하다. 한 사안과 관련된 기사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사 아래쪽에 목록 형태로 제공하거나 프론트 페이지에 몇 개의 제목으로 나눠 제시할 뿐이다.
언론은 사실성 객관성 책임성을 강조하는 디지털 정보의 구조와 양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가 사안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온라인) 저널리즘의 독보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독자와 언론이 뉴스를 매개로 접점을 맺는 활동은 기사 노출과 읽기로 양측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을 목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뉴스에 있는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을 보장하여 독자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는 출발선을 갖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2개의 출고 기사를 내면 2번의 확실한 신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 못박은 제목의 기사는 그만큼 저널리즘에 철저하고 독자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나온다.
갑자기 발생한 중대한 국내외 뉴스에 대해 한국 언론도 뉴스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물론 '중대한 뉴스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언론사별로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다루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직 여건도 차이가 벌어져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다뤄야 하는 관련 뉴스 꼭지가 평균 5건이 넘고 일주일 이상 가는 사안이라면 독립적인 서비스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째, 이 사안을 보도하는 목표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교만한 의도는 버린다. 둘째, 우리가 취재하여 확인한 것을 정리한다. 셋째, 독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넷째, 이러한 기사들과 함께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스 페이지를 구성한다.
국내 대형 언론사더라도 선거, 올림픽 등 전통적인 빅 이벤트 외에는 최신순 기사 리스트(목록) 페이지로 다루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좌표도 없는 셈이다. 언론 스스로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생략한 채, 발생 시점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는 잘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속도감에 취해 마구 기사를 찍어내기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독자를 정보 더미들 속에서 지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나쁘다. 뉴스만 만드는 일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수차례 언론사, 언론단체서 요청하는 강연 주제는 보통 구독, 포털, 콘텐츠 등 전통적인 주제에 요즘은 기술(AI) 이슈가 덧붙여진 정도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 모바일, 2015년 전후 소셜미디어, 2020년 이후에는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그리고 탈포털 전략으로 흘러왔다. 맞닥뜨린 생태계와 경쟁환경에서 필요한 관심사다.
하지만 서비스•뉴스(저널리즘), 독자 관계(커뮤니티), 리더십•조직(문화) 등 원칙과 기본을 다루는 일은 드물다(가끔 커뮤니티 구축 등 연결과 관계 증진, 독자 참여와 보상 등 새로운 영향력 형성 주제를 정하기도 하지만 90여분 강연시간은 겉핥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독자를 중심으로 놓고 저널리즘과 뉴스룸의 비전과 목표를 그려야 하는데 매체와 매체, 매체와 기술(플랫폼) 간의 경쟁과 적용만 앞세운 교육만 넘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언론 현장을 반영한 접근이지만 당장에는 뉴스와 서비스에서 ‘수준’의 문제를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언론 신뢰 개선에는 눈감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최근 모스크바 테러 사건을 다루는 해외 언론의 뉴스 서비스의 ‘작은’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격사건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What We Know about~)'이란 기사 제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신중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세계 혁신 언론사의 기사 제목달기와 특집 페이지 구성, 다양한 포맷의 정보 양식은 저널리즘이 곧 언론사가 끌어올려야 할 혁신 방향이요, 디지털 전환의 목표임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한국 언론도 성찰해야 한다. AI, 콘텐츠 유료화 등은 그 다음의 과정이다.
'Online_journalis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명 독자가 수백 개 데이터 생성" (1) | 2023.08.28 |
|---|---|
| 이용자 콘텐츠 활용시 뉴스룸 절차, 관리규정 마련해야 (0) | 2023.07.17 |
| 뉴스 댓글이 저널리즘 좌우한다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