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퍼스트는 속도와 규모의 차원이 아니다." <기자협회보>에서 완성도가 낮은 신문의 디지털 대응을 짚었다. 나는 이 아이템을 다루는 취재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디지털 퍼스트의 출발점은 뉴스조직에서 독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전통매체의 디지털 퍼스트는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첫째, (미안한 말이지만) 디지털 퍼스트 전담 구성원들은 매체의 핵심 역량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그들 대부분은 편집국을 동경한다. 둘째, 그들이 부여받은 미션은 비과학적이다. 구체적이지도 않다. 디지털 퍼스트는 24시간 프리미엄을 지향한다지만 시장(니즈)와는 떨어져 있다. 셋째, 편집국 기자들과는 물론이고 독자들과의 소통도 체계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독립조직이다. 가혹하게 고독하다. 넷째, 테크놀러지는 후순위다. 트래픽 분석, 독자 파악, 콘텐츠 생산 등 어느 영역에서도 기술은 억제돼 있고 수동적이다."
"<조선일보>는 연초 약 40명의 디지털미디어 기구를 가동했다. 어떤 신문은 편집국 내에 디지털 담당기자가 5명도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또 어떤 신문은 디지털을 사실상 닷컴 조직에 맡기고 있다. 숫적 규모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디지털 퍼스트의 내용을 봐야 한다."
"기자가 디지털 퍼스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도 짚어야 한다. 기자 업무가 재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업무는 부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자들은 가장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단지 기사생산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인 비즈니스도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미디어 이용시간의 대변화가 진행된 최근 십여 년 사이 기자는 '디지털 퍼스트'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디지털화한 기자는 유감스럽게도 '극소수'이며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퍼스트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이동 즉, 문명사적 변화를 수렴하는 전통매체의 혁신 전략이라면 기자들을 각성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닷컴 등 기존 디지털 조직 더 나아가 독자들과의 협업적 사고도 인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뉴욕타임스> 혁신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디지털의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있는 데도 전통매체는 기자들을 준비시키지 못해 왔다. '디지털 혁신'은 얼마나 사상누각인가?"
"시장의 문제도 있다. A, B, C...신문은 최근 수 년 동안 뉴스생산과 서비스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트래픽 감소세는 회복조짐이 없다. 그러나 Z 포털은 최소 2배 이상의 전재료를 챙겨 줬다. 포털은 왜 그랬을까? 디지털 퍼스트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포털의 호응이 이성적이어야 한다. 검색 알고리즘 처방전이 전가의 보도는 아닌 것이다."
덧글. 이 포스트는 기자와 독자들이 '온라인 저널리즘' 전반에 대해 질문한 것들을 답변한 것을 토대로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로 미디어 비평지 기자들의 질문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받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재구성해 보도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론사가 네이버 의존 않고 독자생존할 수 있는가? (0) | 2015.01.14 |
|---|---|
| 사회지도층 위주의 필자 전략 의미 있나? (0) | 2015.01.14 |
| 신문의 신뢰도는 왜 떨어졌는가? (0) | 2015.01.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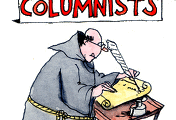

댓글